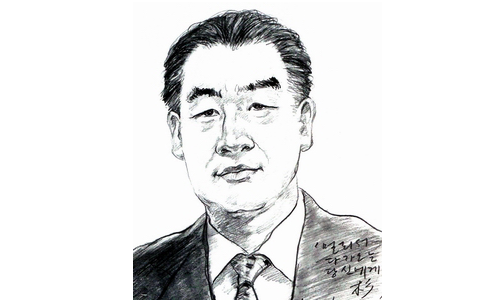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항 공군기지 의전실인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짧았다. 시진핑 주석은 오전 10시30분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의장으로 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오후 1시경 곧바로 미국행 전용기에 올랐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각각 1박2일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들이 동시에 머문 시간은 고작 150분이었다. 그 중 100분이 회담 시간이었다.
두 정상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머물렀다. 이례적으로 시진핑은 한국 정부의 공식 환영식 없이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고, 트럼프는 회담 직후 곧장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라 떠났다. 이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외교 무대에서 ‘시간’과 ‘공간’은 종종 언어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트럼프에게 김해는 단순한 회담 장소였을 뿐이다. 그는 경주 APEC 일정을 건너뛰고, 귀국 직전 시진핑과의 단독 회담만을 위해 경주와 가까운 김해를 택했을 것이다. 반면 시진핑은 한국 도착 직후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고, 이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한국을 비롯 세계 정상들과 연쇄 회담도 이어갈 예정이다.
두 정상 모두 상대방과의 동선을 최소화했다. 이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거리 두기 외교’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같이 있으나 함께하지 않는다”는 냉전식 외교의 부활이자, G2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아닐 수 없다.
김해는 부산 바로 옆이지만, 서울과는 먼 도시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청사가 있는 곳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김해였을까?
먼저 안전하고 중립적인 회담 공간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군 기지 인근이라는 특수성은 양국 모두에 안정감을 줬고, 한반도 남단이라는 지리적 위치도 전략적 부담을 덜어줬다.
또 서울도, 베이징도 아닌 제3의 공간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마주했지만, 정치적 무게가 실린 서울을 피한 점은 절묘했다. 김해는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치적인 도시로, 회담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지였다.
그러나 필자는 김해가 과거 가야의 수도였고, 가야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생존을 택한 중간국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이번 회담 장소로 김해가 선택된 데에는, 오늘의 김해가 미·중이라는 거대한 양국 사이에서 ‘중간을 잇는 접점’의 상징이 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본다.
안타까운 건, 두 정상이 한국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김해를 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트럼프가 한국 일정을 마치고 떠난 직후 시진핑이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 중심 협상가로서 왔고, 시진핑은 전략적 존재감의 연출자로서 한국을 찾았다. 트럼프에게 이번 회담은 귀국 전 마지막 쇼였고, 시진핑에게는 아시아 순방의 출발점이었다. 방향이 반대인 두 외교의 길이 김해에서 교차한 것이다.
이는 상징적이다. 트럼프의 귀국은 미국이 아시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전략적 의지를 보여주고, 시진핑의 입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향한 신호를 담고 있다. 한 공간에서 잠시 교차한 두 노선은 마치 활주로 위의 두 비행기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올랐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은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 수입, 펜타닐 통제,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 등이었다. 최근 양국은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기로 한 100%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를 토대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각 구매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이번 회담은 양국이 무역전쟁에서 일시적 휴전에 들어갔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두 정상이 덕담은 나눴지만 신뢰는 쌓지 못했다. 서로의 존재를 이용했을 뿐, 상호 존중이 아닌 상호 활용의 회담이었다.
한국은 그저 ‘장소 제공자’였다. 경주 APEC과 김해 회담으로 이어진 ‘슈퍼위크 외교’는 분명 한국 외교의 무대 확장이지만, 동시에 ‘무대 위 조연’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중 양국은 한국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손을 잡는다. 이들에게 한반도는 여전히 도구일 뿐이다.
트럼프가 떠난 하늘과 시진핑이 들어온 하늘이 교차한 오늘, 김해는 경주에 이어 또 한 번 세계 질서의 교차로가 됐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 수밖에 없다. 김해 활주로 위에는 이들의 그림자보다 더 큰 메시지가 남게 됐다.
김해에서 두 정상 간 힘은 움직였지만, 신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 외교는 여전히 균형의 외줄을 타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