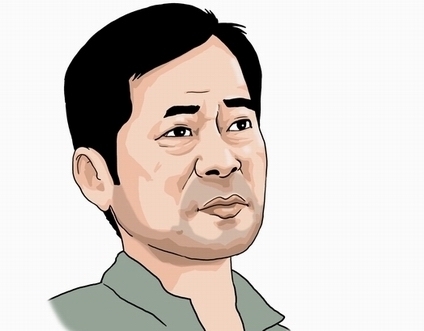
조선조 제26대 임금인 고종 27년(1890) 4월8일의 일이다. 고종이 미국의 신임 공사 허드(Heard)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물었다. “귀국의 대통령은 평안하시오?”
실록에는 이에 대해 “上曰貴國大統領平安乎(상왈귀국대통령평안호)”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 나라에 대통령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다.
그런데 왜 고종은 미국의 President를 대통령으로 지칭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물론 통령(統領)이란 단어는 오래전부터, 한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고종은 통령에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이라 지칭했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상상이 일어난다. 미국이란 나라가 크기 때문에 크다라는, 큰 나라의 통령이라는 의미로 대(大)를 덧붙인 게 아니냐는.
그리고 훗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은 공식 직함으로 등장한다. 당시 왜 대통령이란 직책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통령 중에 으뜸을 의미하기에 그런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조금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대’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앞 글자 ‘대’ 즉 대한민국을 줄인 말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인즉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수라는 의미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대정신으로 언급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한 일을 살펴본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의 언급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후보 단일화 전 상황을 살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의 말이 ‘국민이 바보’라는 말로 들릴 정도다.
필자가 왜 이렇게 강도 높게 질타하는지 필자 아니, 이 나라 삼척동자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자.
안 대표는 시종일관 완주하겠다는, 심지어 제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결기를 보인 바 있다.
그런 안 대표가 한순간 후보를 사퇴하고 윤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윤 당선인이 당선되면 행정 경험을 쌓겠다고 언급했다.
말인즉 윤 당선인과 안 대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선거법 230조 및 232조를 살펴 요약하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매수 및 이해유도의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야합은 법에 문외한인 필자가 살펴도 이 항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비록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란 직책이 천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직책임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추잡한 야합을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에 비유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당선인이 오해하고 있는 대목에 대해 지적하자. 윤 당선인은 총 유권자 대비 약 37%의 지지로 당선됐다.
과반수도 되지 않는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윤석열을 선택하지 않은 63%에 있다. 이 수치,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 거부 세력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런 경우 우리는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해도 상당히 난해하다.
심지어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알까 하는 생각 말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