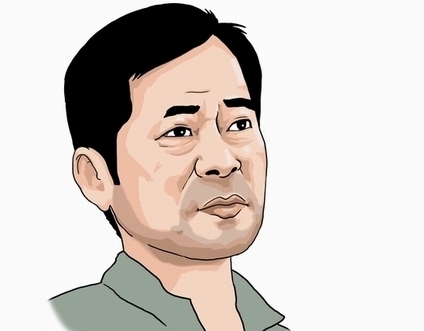
얼마 전까지 인터넷상에서 <일요시사>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었다.
필자의 기억에는 ‘잉크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언론’으로 남아있다. ‘사람 냄새 나는’, 즉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세상’은 공교롭게도 필자의 삶의 철학 중 중요한 대목이다.
정치판을 떠나 문학인으로 변신한 상태서 되돌아본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존재는 발달된 문명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필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인간성을 최우선시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욕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물론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은 인간의 삶에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욕심으로 무장돼있다. 그런데 필자의 욕심은 일반인들의 욕심과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필자 개인의 욕심에서 벗어나자 새롭게 등장한 욕심, 즉 나가 아닌 우리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욕심이다.
그런 필자의 입장서 바라본 작금에 대선 정국은 한마디로 최악이다.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용납할 수 없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지사는 한 자연인으로서도 낙제점 수준이다.
그가 어떻게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는지 의아할 정도다.
그런 그가 여권에서 대통령 후보에 가장 근접해있다는 사실에 황당할 뿐이다.
헌법에서 밝히듯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수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그런데 파렴치한 행위로 여러 개의 전과를 소지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적으로 살필 때 국가 망신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연결된다.
이 지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의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치명적 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른바 법과 정, 즉 사랑에 관한 문제다.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법이 만능이란 착각에 빠져들 수 있다.
정치, 특히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법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극히 미미한 수단에 불과하다.
필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필자는 이 순간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의 심판 대상이 된 적 없다. 필자만 그럴까.
천만에다. 다수의 국민은 법의 존재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극히 일부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의 의미는 무엇일까.
필자는 법에 대해 명쾌하게 ‘필요악’이라 정의 내린다.
즉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재명류를 단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하는 일종의 ‘악’이다.
각설하고, 윤 전 총장 부부가 자식 낳기를 거부했는지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자식 낳기를 거부했다면 이는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한 경우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윤 전 총장은 아버지로서 지녀야 하는 숭고한 희생, 즉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의 행적을 살피면 바로 입증되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회는 사람 냄새가 아닌 법이 판치는 살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