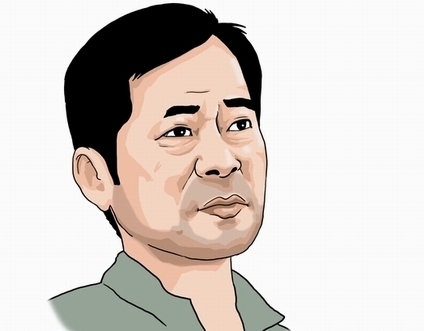
1987년 12월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일이다.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대선후보가 야당을 향해 아리송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약을 발표한다.
먼저 야당에 대한 요구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향해 강력하게 후보 단일화를 주문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양 김씨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표가 분산돼 어느 누구도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두 후보가 단일화해 1대1 대결을 펼쳐 자신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최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동 요구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대목은 다분히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자신과 지지층이 겹치는 김종필 후보를 철저하게 고사시키는 동시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이간질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공약에 대해서다. 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듬해 즉 1988년에 개최되는 올림픽을 치른 뒤 6·29 선언과 모든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동 공약을 발표했을 때 거의 모든 국민은 물론 정치권 인사들도 노 후보가 언급한 중간평가를 대통령 임기 중단과 연계시켜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세하게 살펴보면 임기 중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후일 결국 대통령 임기와 연계되는 중간평가는 위헌 소지 또 국력 소비라는 이유 등으로 물 건너간다.
필자가 상기의 두 건을 사례로 들어 반면교사로 삼자고 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내년에 실시되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다. 최악의 대결이 될 차기 대선과 관련해 사전에 미봉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먼저 지지율과 관련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번 실시됐던 제19대 대선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헌정 사상 2등과 가장 큰 표 차이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율 77.2%인 상황에서 41%의 득표율을 기록한다.
문 대통령의 득표율을 살피면 비록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를 놓고 살피면 그의 지지율은 31.6%에 그친다. 말인즉 문 대통령은 유권자의 3분의1의 지지도 득하지 못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돌려 말하면 대한민국 유권자의 3분의2 이상이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 제66조 1항인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의 자격을 지니게 됐다.
잠시 접고 중간평가로 넘어가보자.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두 사람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나라는 참으로 암담하다. 예상되는 심각한 선거 후유증은 차치하더라도 두 사람 다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파렴치한 전과를 포함해 생색내기로 나라 곳간을 거덜낼 테고 윤 후보는 도덕성 문제에 더해 전형적인 딴따라,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하다.
현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투표율 역시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1의 지지율도 상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준 이하의 자질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느 시점 임기와 연계시킨 중간평가 실시를 권장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