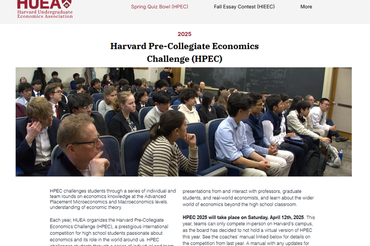최근 몇몇 사람만 기억할 추억의 외상 술집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10년 이전부터 서울 사직동에 있던 명월옥(明月屋)이란 술집이 그곳이다. 지난 1978년까지 운영된 이 술집은 신문기자며 문인, 공무원, 탤런트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 실제 서울역사박물관이 찾아낸 외상으로 먹은 사람 300여 명과 외상 내역을 촘촘히 적은 장부를 들춰보면 반가운 이름들이 수두룩하다. 주인장의 머리숱이 적어 ‘사직골 대머리집’으로 더 널리 알려졌던 명월옥. 이곳에서 조국을, 인생을, 낭만을 노래했던 유명 인사들의 50년 전 대폿집 외상장부를 들춰봤다. 또 1950~60년대 인텔리 주당들의 풍모와 술집 풍속을 엿봤다.
최근 몇몇 사람만 기억할 추억의 외상 술집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10년 이전부터 서울 사직동에 있던 명월옥(明月屋)이란 술집이 그곳이다. 지난 1978년까지 운영된 이 술집은 신문기자며 문인, 공무원, 탤런트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 실제 서울역사박물관이 찾아낸 외상으로 먹은 사람 300여 명과 외상 내역을 촘촘히 적은 장부를 들춰보면 반가운 이름들이 수두룩하다. 주인장의 머리숱이 적어 ‘사직골 대머리집’으로 더 널리 알려졌던 명월옥. 이곳에서 조국을, 인생을, 낭만을 노래했던 유명 인사들의 50년 전 대폿집 외상장부를 들춰봤다. 또 1950~60년대 인텔리 주당들의 풍모와 술집 풍속을 엿봤다.
광화문 일대 공무원, 문인, 기자, 방송인, 교수 등의 사랑방 담당
70년 넘게 이어오며 광화문 터줏대감·정보교환소 역할 ‘톡톡’
‘달아놓아라.’
이 한마디면 될 때가 있었다. 바로 1950~60년대이다. 당시 동네가게에는 저마다 허름한 공책이 걸려 있곤 했다. 외상장부다.
거나하게 술잔 기울이고
나가며 “달아놓으세요”
외상장부는 도시의 점포에도, 시골의 점방에도 눈에 띄었다. 물건을 집어 들고 ‘달아놓아라’ 한마디면 가게주인은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장부에 적힌 외상은 한 달 단위로 몰아 결산하면 그만이었다.
지난달 30일, 중년층의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나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밤을 지새우며 맥주 또는 막걸리 잔을 기울였던 명월옥 외상장부가 공개됐다는 소식이었다. 거의 잊혔던 머리숱이 적은 주인장이 떠오른다. 주인장 덕택(?)에 ‘사직골 대머리집’으로 널리 알려졌던 명월옥의 등장. 그것만으로도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명월옥의 재등장은 세월과 낭만이 가득 담겨 있는 3권의 ‘외상장부’였다. 이 장부는 1950년대 말부터 1962년까지 12년 동안의 외상 내역이 깨알같이 적혀있다. 외상 고객들의 소속 기관·이름·날짜·외상값이 꼼꼼히 나열돼 있다.
장부에 적혀 있는 이름은 300명 정도. 연인원으로 치면 700~800명에 이른다. 서울시청·경제기획원 등 공공기관, 서울신문·동양방송 등 언론사, 서울대·연세대 등 학교, 금융기관에 일하던 사람들이 외상을 그었다.
그런가 하면 장부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이름이 숱하다.
외상장부 중 한 권에는 손님들의 외상내역이 기록돼 있다. 나머지 두 권은 수금을 위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작성됐다. 장부 기록은 기관명, 이름, 금액 등 단순하다. 기관명은 가는 펜으로 적었다. 그 다음 사람 이름을, 그 아래엔 사람별로 외상금액을 썼다. 만일 외상값을 갚을 경우 ‘X’ 표시를 했다. 소속 기관·인명을 먼저 분류해 놓고 날짜와 외상금액을 적은 것으로 보아서 단골손님이 무척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술값은 대부분 1000~3000환(100~300원) 정도다. 가끔 1만환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혼자 먹었다기보다는 회식을 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먹었을 경우다. 한 사람 이름으로 외상을 단 셈.
수록된 기관도 71개 기관에 달한다. 경제기획원과 문교부,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 25개가 장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 16곳도 있다. 조흥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과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동양방송·문화방송 등 언론기관 22개도 이에 가세했다.
명월옥의 사장은 50년을 운영했던 김영덕씨와 대를 이어 20년간 운영했던 사위 이종근씨다. 특히 1960~70년대 이곳은 푸짐하면서도 저렴한 메뉴로 사랑을 받았다. 김 사장과 이 사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인심 좋은 주인장’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장부 수록 인원 3백명
연인원 환산 7~8백명
이는 손님들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반 샐러리맨은 물론 정계와 학계, 문인, 기자 등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많았다는 게 이에 대한 방증이다. 물론 광화문에 신문과 방송사가 집중돼 있었던 영향도 있다.
당시 명월옥을 즐겨 찾았다는 한 인사는 “그때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손님들의 부탁 한 번이면 주인은 이름과 금액을 외상장부에 적어놓기만 했다”고 회고했다.
또 다른 인사는 “외상을 그었다가 끝까지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떼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래도 주인장은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외상 인심’을 베풀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도 “당시에는 외상값을 할부로 갚는 것도 가능했으며 미수금이 있거나 뚜렷한 직장이 없어도 외상을 주기도 했다”면서 “문화인, 언론인, 관료들이 집 드나들듯 편하게 시간을 보냈고 오는 손님은 물론이고 주인조차 돈 이야기 없이 편하게 마주했던 장소였다”고 귀띔했다.
이경식·진념·조지훈·최일남·장일남·김대벽·이구열 등 눈에 띄네
최불암·박근형·백일섭·변희봉 등 단골 손님 배한성·황인용 이름도
실제 명월옥은 광화문 일대 공무원, 문인, 기자, 방송인, 교수 등의 사랑방이었고 정보교환소였다. 70년 넘게 대를 이어오며 광화문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것. 때문에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고 인수자를 찾지 못해 1978년 10월5일 문을 닫았을 때 단골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듯 무거웠다고. 서울역사박물관 한 관계자는 “대머리집 등 옛날 광화문 뒷골목 술집들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었다”면서 “관료·문인·언론인·연기자들이 모여 인생과 낭만을 노래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일종의 문화 사랑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이곳을 단골술집으로 벗 삼았던 유명 인사들은 누구일까. 우선 시인 조지훈·문인 최일남·작곡가 장일남·사진작가 김대벽·미술평론가 이구열씨 등이 눈에 띈다. 또 당대 문인으로 활동한 김기팔·박재삼·이성부·정현종씨 등도 등재돼 있다.
이들은 명월옥에서 낭만을 얘기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외상장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비목’의 작곡가 장일남씨는 이 집의 큰 단골로 통했다. 공공기관장들 중에선 이경식·진념 전 부총리가 눈에 들어온다. 이들은 이곳에서 조국을 얘기하며 술을 마시다 외상을 달고 나갔다.
연기자들 중에선 최불암·이순재·박근형·백일섭·변희봉·오지명·김성원 등이 즐겨 찾았다. 아울러 김재형·김성겸·김종결·박병호·연규진·정해창·표재순 등도 가세했다.
이들은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론을 안주삼아 술을 마셨다. 성우 배한성과 MC 황인용도 이곳에서 삶과 인생을 배워가며 술잔을 기울였다. 실제 황인용은 당시 자장면 24그릇 값인 360원어치를 외상으로 먹은 뒤 갚았다. 당시 자장면 한 그릇이 15원, 80㎏짜리 쌀 한 가마니가 3000원 수준이었다. 언론인들도 한몫을 거들었다. 정영일·이규태·남재희·손세일·김중배·염재용·강성구·홍두표·최종율·권도홍씨 등이 그 주역들이다. 조용만 고려대 교수도 단골이었다.
이름 대신 ‘대합조개 좋아하는 사람’ ‘필운동 건달’ 등 인상착의나 좋아하는 메뉴를 대신 기재한 경우도 더러 있다. 이들은 서글서글한 눈빛을 돈 대신 건네며 외상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진다.
외상 내역을 좇다 보면 한 개인이 직장을 옮겨간 이적(移籍) 경로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일례로 장부를 보면 공석하씨는 당시 국도신문에서 민족일보로, 다시 경향신문으로 직장을 옮겼다.
문인·공공기관장·연기자·언론인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어
한편 이 외상장부는 당시 단골이던 극작가 조성현씨가 식당 주인에게 전해 받아 보관하던 것들로 오는 9월20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광화문 年歌(연가): 시계를 되돌리다’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대머리집이 있던 곳에 현재 아파트촌이 들어서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