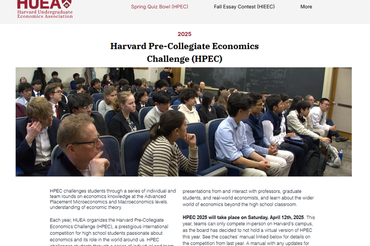당적 버리고 ‘집안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당적 버리고 ‘집안 일’에 ‘감 놔라 배 놔라’친박계 정조준 정치 훈수에 정치 중립 휘청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김형오 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여야에 대한 훈수를 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데 이어 계파갈등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엄정중립’을 위해 당적을 갖지 못하는 국회의장의 신분으로는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여야 입장차로 6월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박연차 리스트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등 민주당의 요구안에) 한나라당이 원천적으로 수용 못 할 요구 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토씨 한 자 고치지 않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뜻도 아닐 것”이라면서 “정치적 타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조문정국’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 “국정을 이끄는 집권세력은 전국적으로 이어진 조문 행렬의 의미를 무시하면 안 된다. 현 정부에 워닝(경고), 그것도 굉장히 강한 워닝을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당에는 “야당이 국회를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언젠가는 그 부담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역대 야당들도 장외 열기를 즐기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 고전하곤 했다”면서 “늦지 않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국회의장의 일갈인 셈이다. 그러나 조문정국에 대해 “여당으로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우리 국민의 정서적 측면이 작용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친정’인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이 곳곳에 묻어났다.
‘미디어법’에 관해서도 “미디어법은 국가보안법이나 사학법처럼 이념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 아니다. 방송지분 참여 폭을 놓고 서로 협상하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정치 이념화하려는 흐름에 정치권이 휘말려 문제를 스스로 꼬이게 만들고 있다”면서 은연중에 야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김 의장은 여당 내부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정이기는 하지만 당적을 떠난 의장으로서 여당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화합이니 쇄신이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다. 국민이 보기에 (친이계나 친박계) 양쪽 모두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 측에 한마디 하고 싶다”면서 “친박 진영은 역대 정권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비주류가, 그것도 집권 초반기에 등장한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처럼 정치사에 없는 역할에 대해 자기 정립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친박 진영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고전하는 가운데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유지된 것이 박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갑자기 외면하기 시작한 것을 친박 진영도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금까지 친박 진영은 ‘우리는 비주류니까’라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홍수에 책임 있는 사람 집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집도 함께 떠내려간다”면서 거듭 ‘화합’을 위한 친박계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 없이는 박 전 대표의 미래도 없다’는 친이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최근 당내 움직임에 대해 “마치 친박계가 당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불편한 시선을 주고 있는 친박계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은 것.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오랫동안 한나라당과 함께해왔던 만큼 시끄러운 당내 문제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