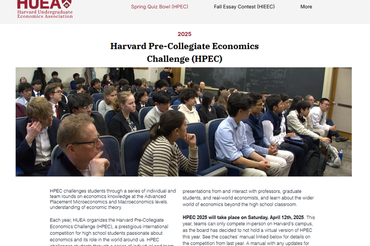삼양금속 염두에 둔 3세 후계 시나리오 완성 단계
내부사정 철통보안…대부분 계열사 물량으로 유지
대한전선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후계구도의 핵인 삼양금속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격인 삼양금속은 대한전선그룹 일가가 수년간 공들인 경영승계에 마침표를 찍을 준비로 분주하다. 하지만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비상장사란 이유로 매출과 임원 등 일반적인 경영정보만 노출돼 있을 뿐이다. 대한전선그룹의 등에 업힌 ‘비밀 곳간’의 실체를 캐봤다.
대한전선그룹의 후계구도는 확정된 상태다. 경영권 승계 주인공은 양귀애 명예회장의 장남 설윤석 상무다. 설 상무의 등극은 새삼 놀라울 일이 아니다. 그는 일찌감치 ‘황태자’로 낙점됐다.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가 걸림돌이지만 이미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모양새다.
설 상무의 첫 수저가 닿은 반찬이 바로 삼양금속이다. 문득 모회사인 대한전선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삼양금속이 대한전선보다 상위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상장시 대물림 ‘쫑’
 대한전선그룹은 삼양금속과 대한전선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오너일가는 두 회사의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현재 삼양금속과 대한전선의 지분을 각각 100%, 22.99%씩 보유하고 있다.
대한전선그룹은 삼양금속과 대한전선을 중심으로 20여 개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오너일가는 두 회사의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현재 삼양금속과 대한전선의 지분을 각각 100%, 22.99%씩 보유하고 있다.
삼양금속은 설 상무가 지분 53.77%로 최대주주이며 그의 동생 윤성씨가 36.97%, 양 명예회장이 9.26%를 갖고 있다. 대한전선의 경우 삼양금속(28.40%·최대주주)에 이어 설 상무(15.51%), 윤성씨(5.37%), 양 명예회장(2.11%) 등의 순으로 대주주가 구성돼 있다.
이들은 최근 대한전선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발행한 35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워런트·Warrant) 일부를 사들여 지분율을 높였다.
업계에선 이번 BW 워런트 매입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로 보고 있다. 설 상무로선 향후 지분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BW 워런트의 확보가 승계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종의 ‘바리케이드’역할인 셈이다. 삼양금속이 BW 워런트를 매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관측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한전선그룹은 경영악화로 유동성 마련에 분주한 와중에도 경영권 승계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고 있다”며 “아직 미진한 설 상무의 경영능력 검증과 동시에 삼양금속이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대물림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격인 삼양금속은 1971년 설립된 뒤 1987년 대한전선그룹에 인수됐다. 삼양금속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 3월 고 설원량 회장이 세상을 뜬 전후다.
당시 설 회장은 대한전선 보유지분을 설 상무 등 가족과 삼양금속에 넘겼는데 이는 대한전선 2대 주주였던 삼양금속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 대한전선의 최대주주가 설 회장에서 삼양금속으로 바뀐 것.
설 회장은 또 삼양금속 보유 지분을 자녀들에게 상속, 삼양금속을 염두에 둔 후계체제 구축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설 회장 일가는 상속세로 1355억원을 신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세간에 알려진 사실들은 여기까지다. 삼양금속의 내부 사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하다못해 그 흔한 홈페이지도 없다. 다만 간간이 밝히는 공시 등을 통해 매출과 임원 등 일반적인 경영정보만 노출돼 있을 뿐이다.
설 회장 타계 직후 ‘삼양금속 키우기’를 본격화한 대한전선그룹은 2004년 삼양금속의 자본금을 400억원에서 87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 뒤 2006년부터 ‘그룹 2인자’ 임종욱 부회장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겼다.
2003년부터 대한전선 대표이사도 겸직한 임 부회장은 설 회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 양 명예회장 대신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임 부회장은 설 상무의 ‘스승’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양 명예회장은 일주일에 2∼3차례만 출근, 임 부회장으로부터 주요 경영상황만 보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회장은 지난해 말 삼양금속 사내이사직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빈자리엔 김창린 대한전선 부사장이 채웠다.
삼양금속은 조용하지만 실속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의 총자산은 2006년 479억원에서 2007년 783억원, 지난해 847억으로 늘었다.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79억원, 160억원을 기록했다. 상시 직원이 5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삼양금속의 자생 능력이다. 대한전선이 삼양금속에 일감을 밀어주고 있는 것. 대한전선은 자사에 필요한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양금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양금속은 당초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압연 등의 제품을 생산했지만 1994년 기존 사업을 대한전선에 넘겼다. 이후 대한전선이 생산하는 전선에 필요한 전기동의 수입대행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삼양금속은 대부분의 매출을 대한전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회사의 업무와 영역이 서로 겹칠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한전선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꼬박꼬박 삼양금속에 일거리를 넘겨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2006년 재벌그룹의 ‘문제성 거래’를 지적한 참여연대의 발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참여연대는 ‘일감 몰아주기’로 지배주주의 안정된 부의 축적을 실현시킨 사례로 대한전선-삼양금속 간 거래를 지목했다.
대한전선에 기생
실제 삼양금속이 대한전선과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 비중은 1999년 99.81%, 2000년 99.76%, 2001년 99.67%, 2002년 99.06%, 2003년 75.30%, 2004년 99.16% 등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대한전선이 삼양금속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해 줘 지배주주에게 지원성 거래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삼양금속은 2003년 한 해를 제외한 1999∼2004년간 총매출의 99% 이상이 대한전선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전선과 삼양금속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삼양금속의 주력사업이 전선에 필요한 전기동 수입이고 타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수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선업계 특성상 다른 전선 회사에서 물량을 수주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며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 없지만 계열사의 의존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베일 대청기업은?
대한전선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계열사가 있다. 바로 대청기업이다. 다른 계열사와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대청기업은 100% 오너일가의 소유다.
대청기업은 양귀애 명예회장의 장남 설윤석 상무와 차남 윤성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일각에서 대청기업이 대한전선 황태자들의 용돈벌이 창구 또는 호위기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985년 설립된 대청기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주업종으로, 현재 서울 회현동 그룹 사옥에 자리 잡고 있다. 2001년 4억5000만원, 2002년 5억4000만원, 2003년 2억7000만원, 2004년 2억5000만원, 2005년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006년부터는 매출 등 어떤 자료도 공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