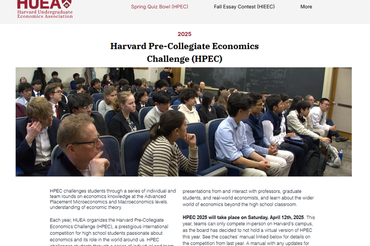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요즘에도 일반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는 정보가 있다. 공공기록 중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자료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어림짐작 해볼 방법은 있다.
국가 기밀자료 가장 많이 만드는 곳 어디?
경찰청, 중앙보다 지방이 ‘비밀 보따리’ 많다
이러한 자료들은 매년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고되는 것. 안을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각급 기관들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을 통해 그늘에 가려진 ‘비밀’의 크기를 살펴봤다.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하게 숨겨둔 ‘비밀’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각급기관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8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은 총 5만524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은 1만1630건이었다.
5만건의 비밀 ‘쉿’
이러한 비밀기록들은 1~3급으로 나뉜다.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1급,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2급,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3급에 속한다.
이러한 비밀기록들을 가장 많이 생산한 곳은 어디일까. 각 기관별 비밀기록 생산량을 살펴본 결과 업무의 특성상, 기밀사항을 많이 다루는 국방부가 1위를 차지했다. 국방부가 한 해 동안 생산하는 비밀기록은 1만283건으로 전체 5만5244건의 18.6%를 차지했다. 다만 비밀 등급별로는 2급이 7738건, 3급이 2545건이었고 1급은 한 건도 없었다
.
국방부 외에 서울지방경찰청이 9984건, 외교통상부가 6357건 등 국가안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많은 ‘비밀’을 안고 있었다. 다만 경찰청의 경우 특이한 형태를 보였는데, 중앙청에 비해 지방청의 비밀 생산량이 훨씬 많았던 것. 중앙경찰청의 비밀 생산량은 761건인데 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9984건이었다. 강원도경찰청, 인천경찰청도 각각 1254, 804건으로 중앙경찰청보다 비밀생산량이 많았다.
보통 중앙이 더 많은 업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비밀을 다룰 것 같지만 실제 비밀기록 생산현황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 ‘2010년 각급 공공기관 및 공사의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비밀기관 중의 비밀기관이다.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1급 비밀이 200건이 넘는 것. 하지만 이같이 충격적인 결과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국가기록원 문의 결과 철도공사가 대외비로 설정한 것을 직원들의 착각으로 1급 비밀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각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은 물론 교육청과 공기업, 국공립대학들도 비밀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서초구와 부산지방경찰청이 2건, 법무부·서울지방경찰청·수원시·서울시 강서구·태백시가 1건의 1급 국가비밀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선을 끌었다. 전체 1급 국가비밀 257건 중 철도공사의 1급 비밀 228건이 대외비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실제 1급 비밀은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자료는 국가기밀에 대한 ‘대략’의 상황을 추론할 수 있을 뿐 확실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4곳 중 한 곳이 해마다 한 차례씩 ‘비밀기록물 생산 현황’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요청해 받은 ‘비밀기록물 생산 현황 통보 결과’에 따르면 641곳 공공기관 가운데 153곳(23.8%)이 아예 비밀기록물 생산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해제 및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현황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법무부,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권력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이 “비밀기록물 현황을 제때에 통보하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국정원은 각 기록물관리기관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세우고, 국정원장이 이를 책임지도록 돼 있는 기관임에도 정작 자신들은 비밀기록물 현황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에 ‘비밀기록물 생산 현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대북정보를 직접 다루는 통일부의 경우 ‘단 1건도 비밀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알려온 것. 통일부는 비밀 등급별(1~3급), 형태별(문서·도면·시청각·간행물 등), 생산·보유별 구분에 따라 48가지로 분류된 생산 현황 통보란에 모두 ‘0건’으로 표시해 제출했다.
그나마 올해에는 121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음을 알렸다. 1급 비밀은 없었지만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2급 비밀이 29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이 92건이었다.
‘비밀’ 치우니 ‘비공개’
이런 비밀기록들도 비밀이 해제돼 ‘일반 문서’로 재분류되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밀이 해제돼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을 곧바로 ‘비공개 문서’로 다시 지정해 일반 공개를 차단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6월 외교통상부에 요청해 받은 ‘2007년 외교통상부 북미 1·2과 비밀해제 문서 목록’에는 전체 4846개 문서 제목 가운데 4395개(90.6%)를 먹칠해 알아볼 수 없게 했던 것.
이에 대해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상당수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아 비밀 기록을 얼마나 생산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며 “비밀 해제된 기록물에 대해 자의적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