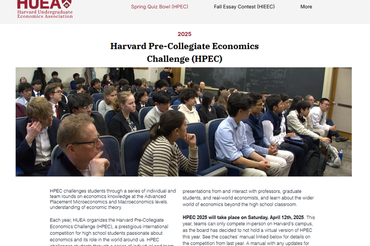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이 무산됐다. 금융위 해체, 금감위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같은 논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불투명해졌다. 이 철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후퇴가 아니다. 금융개혁의 문이 닫힌 것이며,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 병폐를 뜯어고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개혁이 좌절된 자리를 메우는 건 국민의 불안과 파생상품으로 뒤덮인 지뢰밭이다.
자동차는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식품은 성분 검사를 거쳐야 마트에 깔린다. 약은 임상실험을 마쳐야 약국 진열대에 오른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수천만원, 수억원이 들어가는 상품인데도 사전 검증이 없다.
이로 인해 복잡한 구조 속 위험은 가려지고, 화려한 광고와 판매자의 입담만 남는다. ‘투자자 책임’ 서류 끝에는 늘 같은 면책조항이 붙는다. 한국 금융의 현실이다.
한국에서 불완전판매는 관행이 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에서 4000여명이 8000억원을 날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2조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다. 피해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판매사는 수수료를 챙겼고, 감독기관은 사후 제재에 그쳤다. 금융사 임직원은 퇴직금을 챙겨 떠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은 사라졌다. 이쯤 되면 감독의 무능은 우연이 아니다. 금융권과 감독기관, 정치권이 서로 얽힌 카르텔의 산물이다.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있듯, 금융에는 ‘전관 감독’이 있다. 금융사 임원이 감독기관으로, 감독기관 인사가 금융사로 옮겨다니며 서로를 보호한다. 심판과 선수가 같은 식탁에 앉아 파티를 즐기면서 제대로 휘슬을 불 리 없다. 감독은 독립적 감시가 아니라 담합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금융개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문제는 이 카르텔이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방치하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파생상품의 위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은행이 발행하는 ELS 규모만 2023년 기준 70조원에 달한다. 변액보험 적립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곱버스·인버스 같은 레버리지 ETF까지 합치면, 한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파생 구조에 얽혀 있다.
투자자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옵션과 스왑이 뒤섞인 복잡한 파생 구조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개인은 법적으로 장외파생 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없고 증권사나 선물사 계좌를 통한 선물, 옵션 거래도 상당 부분 제약이 있다. 하지만 증권사가 포장해 내놓은 파생 연계 상품은 누구나 살 수 있다. “직접은 위험하니 금지, 포장해 팔면 괜찮다”는 이 자기모순은 감독기관이 작정하고 만든 싱크홀이다.
마약을 직접 투약하면 안 되지만 제약사가 농도를 조절해 만들면 괜찮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장외파생상품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장외파생 명목 잔액은 600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세계 GDP의 7배에 해당한다. 한국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체결한 스왑 계약은 파편적으로만 보고된다.
감독 당국이 구조를 이해하거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리스크 관리는 말뿐이고, 현실은 방치한다.
2024년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2경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가운데 통화선도와 이자율 스왑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으로 맺어졌는지는 블랙박스 속에 숨어 있다.
은행·기업·보험사 간에 체결된 수많은 스왑 계약은 보고조차 파편적으로만 이뤄지고, 감독 당국은 전체 그림을 파악하지 못한다. 숫자는 발표되지만, 진짜 위험은 통계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두렵다. 더 우려되는 건, 미국 리먼 사태 때처럼 자산 자체가 파생화·유동화되어 변질되는 경우다.
부동산이 CDO로, 대출이 MBS로 포장됐듯, 한국의 예금·채권·부동산 자산 일부도 이미 파생 연계 구조에 얽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 실제론 그림자의 파생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금융감독 실패는 반복됐다. 독일의 와이어카드(Wirecard) 사태가 대표적이다. 유럽의 스타 핀테크로 불리던 와이어카드는 결제와 전자금융 분야의 혁신 아이콘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회계장부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현금 20억유로가 있었다. 금융감독당국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시장의 경고를 무시했고, 오히려 와이어카드를 비판한 언론과 투자자들을 공격했다. 감독기관이 금융사의 방패로 전락하자, 수십만 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독일 금융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감독이 눈을 감는 순간, 금융사는 방패 뒤에서 마음껏 부정을 키웠다.
미국도 극명한 예시를 보였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치달았던 금융위기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불과 2년 전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은 작은 은행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금리 급등기에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제대로 헤지(회피)하지 못한 구조적 리스크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감독 당국이 이미 위험 신호를 알고도 손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적 압박과 업계 로비에 눌려 조치를 미루는 사이, 충격은 파산으로 이어졌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수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미국 은행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다. 감독이 늑장을 부리면 작은 불씨가 곧 대형 화재로 번진다.
위험의 크기를 특정할 수 없는 특성상, 파생의 실패는 은행이나 증권사 하나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몰락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을 가졌다. 사실 금융사가 위험을 키우는 건 예측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감독기관이 눈을 감는 순간, 그 위험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선 감독기관이 금융사의 방패가 됐고, 미국에선 감독이 뒷짐을 지다 위기를 키웠다. 한국은 지금 어떤가. 개혁은 무산됐고, 파생상품 검증 시스템은 없다. 감독기관은 전관과 회전문 인사로 엮여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와이어카드의 독일과, SVB의 미국을 동시에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먹는 라면에도 나트륨 함량이 표시된다. 라면 한 그릇을 먹을 때도 건강과 식품 안전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다. 금융상품은 자동차보다, 식품보다, 약품보다 위험하다. 그런데도 금융상품에는 성분표시조차 없다. 감독과 검증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다.
금융개혁이 무산되면서 그 안전장치를 만들 기회마저 사라졌다.
금융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 기업의 운명, 국가 경제의 안정이 걸린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이제는 금융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품에 성분과 안전표시 의무를 만들어야 할 때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 개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면서 파생의 그림자는 더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았다.
금융개혁의 문이 끝내 닫히면서 우리는 파생의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