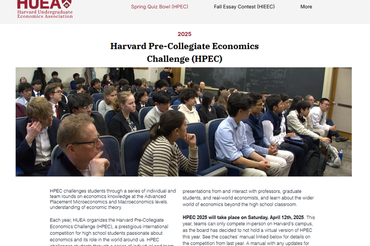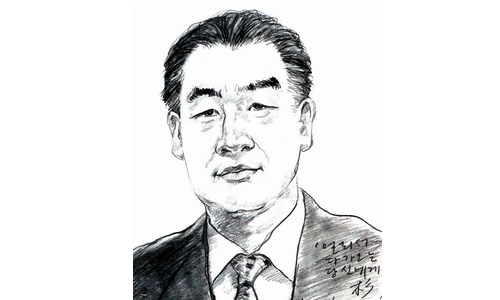
지난달 하늘나라로 가신 고모님은 병상에 누워서도 매일 예능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셨다고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삶을 버티게 한 의식이었고, 아픈 몸이 다시 자연과 연결되는 통로였을 것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통해 고모님은 “나는 아직 살아 있다”는 감각을 되찾으셨는지도 모른다.
SBS와 MBN의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는 10년 넘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사는 자연인들의 이야기가 시청자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로의 방식에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왜 늘 실패한 노인, 혼자 사는 노인만 산으로 가야 하는가? 왜 성공한 노인, 행복한 부부 노인은 화면에 나오지 못하는가?
프로그램 속 인물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실패한 노인들이다. 사업이 망했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끊겼거나 병으로 쓰러진 뒤 삶을 포기한 이들이 많다.
이들이 자연 속에서 새 삶을 찾는 과정은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의 단면을 드러낸다. 노인은 패배자여야만 감동의 주인공이 되는 구조 말이다.
하지만 현실의 노인 세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은퇴 후에도 농사를 지으며 자립하는 노인, 부부가 함께 산촌에 들어가 이웃과 어울리는 노인, 첨단기술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꾸려 후배 세대와 정보를 나누는 노인도 많다.
이들은 자연 속 고독이 아니라 공존의 자연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절실히 들어야 할 메시지다.
노년을 도피가 아니라 확장의 시기로 보여주는 방송, 실패가 아니라 성숙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자연은 패자의 피난처가 아니라, 성숙한 인간의 또 다른 무대일 수 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그 시선을 바꿀 때, 비로소 진짜 자연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시간이 갈수록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과 생존담으로만 채워지고 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 곧 외로움의 대명사로 굳어버린 셈이다.
물론 홀로 남은 노인은 많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고독의 낭만화가 아니라 함께 사는 희망이다. 자연 속에서도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노년에도 여전히 웃고 대화하는 장면이야말로 진짜 힐링 아닐까?
왜 제작진은 이런 부부 노인의 이야기를 꺼려 하는가? 혼자 사는 노인의 고난은 감정적으로 강렬하지만, 부부 노인의 일상엔 더 깊은 울림이 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인의 절반이 배우자와 함께 살지만, 미디어는 혼자 사는 노인만 비춘다. 그렇게 노년은 외로움의 상징으로 고정되고, 함께 늙어가는 행복은 사라진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진정한 위로의 프로그램으로 남으려면, 혼자의 생존이 아닌 둘의 동행을 조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자연의 법칙이다.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왜 산에는 실패한 노인만 있고, 성공한 노인은 없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도시에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뒤 스스로의 철학과 여유로 자연을 선택한 성공한 노년의 이야기도 전해야 한다.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 회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산을 찾은 이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프로그램 속 인물 대부분이 홀로 사는 남성이라는 점도 바꿔야 한다. 왜 부부가 함께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는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밭을 일구고,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부부의 자연인 이야기는 훨씬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감동을 준다.
우리 사회가 진짜로 배워야 할 노년의 모델은 바로 그런 함께 사는 자연인들이다.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는 실패의 회귀가 아닌, 성숙한 선택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자연으로의 귀의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란다.
제작진은 <나는 자연인이다>가 처음 의도한 자립과 자연 회귀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의 실상을 은폐하는 미화로 비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연 속에서 행복하다”는 말 뒤에는 “도시에서 버틸 수 없었다”는 사회의 실패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 의료 공백, 사회적 돌봄의 부재를 자연이라는 배경 위에 던져야 한다. 성공한 노인이나 행복한 부부 노인의 삶을 조명하고, 초고령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공공 다큐로 거듭나야 한다.
자연 속 노인이 아니라, 노인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힐링이며, 이 프로그램이 초고령사회에 빠진 대한민국에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