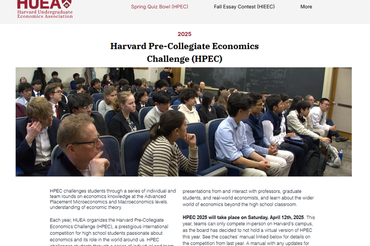한해 수백억 들여 일년 내내 전국이 ‘축제장’
3일 행사 7억, 3년간 한 행사 143억 쓰기도
우리나라는 가히 ‘축제의 나라’라 불릴 만하다. 지역에서 축제를 여는 것이 유행하면서 도 단위는 물론 시·군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축제를 열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수많은 지역 축제로 인해 1년 12달 중 ‘축제 없는 달’을 꼽는 게 불가능해졌을 정도다. 이로 인한 문제도 상당하다. 특색 있는 축제는 찾아보기 힘든데다 돈만 쏟아 붓고 내실을 챙기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 것.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억’소리 나다보니 문제는 더 심각하다.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고 올해도 지자체에서 연 축제는 ‘풍년’이었지만 ‘남긴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서 축제를 남발하는 동안 ‘구멍 난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간 예산은 ‘억’소리가 절로 난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다. 올해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제는 ‘소통하는 몸짓’. 그렇다면 이는 얼마의 예산으로 만들어낸 작품일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프로그램과 행사소요예산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쓰인 예산은 143여 억원에 달한다.
억소리 나는 축제
2008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나눠서 네 번의 축제를 진행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84여 억원이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13억8000여 만원을 지원했으나 나머지는 ‘혈세’였다.
‘서울의 봄, 희망으로 피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에는 29여 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중 기업에서 6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소요예산은 30여 억원 정도다.
서울시는 또 3년간 빛축제를 여는데 43여 억원을 사용키도 했다. 2007년 ‘하이서울 루체비스타’, 2008년 ‘순백의 겨울, 순수의 서울’, 2009년 ‘빛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빛축제에 각각 14억원, 12억원, 16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
정보공개센터 측은 “2009년 말 서울시 채무액은 3조 2454억원”이라며 “3조가 넘는 빚을 안고 있으면서 빛축제다 뭐다해서 갖가지 축제를 진행하고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사용되는 하이서울페스티벌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시민들에게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안녕’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제에 대해서라면 경기도도 빠지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축제를 여는데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 때문에 연초 지난해 125개에 달했던 도 내 축제를 올해 93개로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매년 2억원씩 지원해온 여주·이천·광주 등 3개 시·군의 도자기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도자비엔날레축제도 내년에는 지원 예산을 83억원에서 4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한 것.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도내 지자체 축제는 눈에 띄게 줄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취임하면서 도내 지자체 축제가 1년 사이 13개나 줄어든 것.
올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26개 시·군에서 76개 축제를 개최했거나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해 지자체 주관의 축제가 89개 열렸던 것에 비해 13개나 줄어들었다. 관련된 예산도 지난해 388억원에서 342억원으로 10% 감소했다. 도가 축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다 지자체의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축제를 폐지한 것. 하지만 아직도 시·군별로 3개 정도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 중 화성시는 봄사랑 가족축제, 화성포구축제, 정조효행문화제, 병점떡전거리축제, 제부도장어잡기축제, 용주사승무제, 전통민속축제, 화성가을걷이축제 등 지자체 중 가장 많은 8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해 쓰이는 예산은 7억8100만원 정도다.
파주시는 파주예술제, 2010파주헤이리 판 페스티벌 등 7개 축제에 25억4000만원을, 용인시는 용인포은문화제, 사이버페스티벌 등 6개 축제에 14억3400만원을, 부천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무형문화엑스포 등 5개 행사에 103억800만원을 사용했다.
경기도가 직접 진행하는 축제 중에는 ‘디자인 페스티벌’이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매년 진행할 사업으로, 2009년과 2010년도에는 디자인기반을 조성하고, 2011년도에는 디자인 저변 확대, 2012년도에는 디자인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보공개센터가 ‘경기Design Festival 2010’의 행사목적 및 개요, 행사 소요예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3일간의 행사에 7억2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에는 도비가 5억2000여 만원, 참가 기업의 부스 임대료가 1억9800여 만원 쓰였다.
경기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인 참가 분위기가 많이 확산됐고, 앞으로도 전문가 위주의 공공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서 대중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남 망하면 나도 같이?
‘축제’에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지역으로는 광주·전남이 있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각종 축제에만 5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이중 광주는 지난해 10개 축제를 개최하며 42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해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다. 축제 하나당 42억원의 예산을 쓴 것.
하지만 지자체가 여는 축제는 들인 예산은 많아도 수익은 적은 곳이 상당하다. 지난 2008년 처음 열린 한 지자체의 축제는 혈세 150여 억원을 포함해 4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쓰였지만 수익은 140여 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사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축제들이 줄을 잇는 와중에도 국민의 혈세는 착실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들의 선심 행정 혹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축제를 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