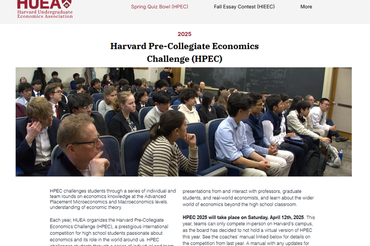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이, 사필귀정이지. 그것이 사필귀정이야.”
매창이 가만히 사필귀정을 되뇌었다. 한눈에도 허균이 그 말에 무슨 깊은 사연이 맺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때문이었다.
“자세히…”
“매창이!”
무슨 사연이?
매창을 부르는 허균의 말에 격정이 일고 있었다.
“나는 그 두 분으로 인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의 기초를 달성할 수 있었다오.”
“그런데요?”
허균이 다시 잔을 들어 깨끗이 비워냈고 매창이 급히 안주를 집어 들었다.
그 손을 허균이 정중하게 거부했다.
“매창이, 나는 그 일이, 나에게는 마냥 좋은 그 일이, 형님에게 무덤이 될 줄은 추호도 알지 못했으이.”
“네, 무덤이라니오!”
“암, 무덤이었지. 무덤이었고말고.”
“무덤이라 하시면.”
허균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매창의 눈가에도 이슬이 어리기 시작했다.
“나리…….”
“나의 형님도 결국 그 일로 노중 객사하고 말았다오.”
“노중 객사라니요!”
“그것이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으나 나의 형님도 아버지처럼 결국 집이 아닌 곳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다오.”
매창은 허균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따름이었다.
“형님은 결국 속세의 모든 벼슬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결국 금강산 부근에서 병을 얻어 사망하고 말았다오.”
“형님과 백운산에서 헤어지고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소.”
“형님을 놔두고요?”
“놔두기는. 형님의 선택을 존중한 결과지.”
“형님의 선택이요?”
“함께 집으로 가자고 매달렸건만 형님은 사명당 스님과 함께하겠다고 그분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다오.”
“왜요?”
“그러니까 백운산에서 형님은 형님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의 길을 향했던 게요. 내 경우는 어머니도 계시고 또 아내와 갓 태어난 딸아이가 있었으니 돌아갈 수밖에.”
”그러면 형님과는 그것이 마지막이었던가요?”
허균이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달로부터 형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허균이 급히 팔봉을 대동하고 온갖 약재를 마련하여 허봉을 찾았다.
금강산 부근의 한 암자에서 사명당과 함께 기거하는 형님을 만났다.
이전에 보았던 형의 모습이 아니었다.
뼈에 살을 살짝 붙인 듯 앙상했고 게다가 얼굴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저절로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곁에서 사명당이 청아한 목소리로 불경을 낭송하고 있었다.
“형님!”
“뭐하자고 이리도 헛걸음하는 게냐.”
“이번에는 반드시 형님을 모시고 가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허균이 제 딴에는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러나 말끝이 슬며시 기어들어갔다.
그를 감지했는지 허봉이 슬그머니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는 늦은 듯하구나.”
“형님, 늦었다니요.”
“이미 나라는 인간은 속세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변했다 이 말이다.”
속세라는 이야기에 허균이 사명당에게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에게 자문을 구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허균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사명당의 낭송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균아.”
“네, 스승님.”
“세상은 여러 곳이 있는 법이다.”
“여러 곳이라 하심은.”
“네가 거하는 곳도 인간들 세상이고 또 네 형이 거하고자 하는 곳 역시 인간들의 세상이라 이 말이다.”
사명당이 잠시 사이를 두었다.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금강산에서 사망
부질없는 세상 일…순리 원해도 역리 강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거할 때를 제대로 찾아서 거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허균이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다.
결국 자신이 거할 곳은 인간들의 오만가지 추악함이 묻어있는 세상이고, 형은 그런 부류들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이니 바로 사명당의 곁을 일컬음이라 생각했다.
“너의 형은 이미 속세의 일들이 모두 부질없음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들과 떨어져서 남은 세상 보내겠다는 이야기니라.”
허균의 시선이 다시 허봉에게 옮겨졌다.
그 시선에 허봉의 따뜻한 미소가 전달되어졌다.
“균아.”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형의 얼굴을 주시했다.
“세상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겠니.”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세상일이란 순리를 앞세우는 나에게 역리만을 강요하더구나. 그러니 내가 어찌 속세에 거할 수 있겠느냐.”
“역리라고 하심은.”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더냐. 바로 손곡 아니냐.”
“그런데요.”
허봉이 가느다란 미소를 흘렸다.
“그런데 세상은 나와 손곡을 원수로 만들어버렸지.”
이달의 스승이신 박순을 일컬음이었다.
형이 박순을 집요하게 공격하고는 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니 그런 내가 이달에게는 어떻게 비쳤겠느냐. 그런데 그 무던한 친구는 제 스승을 그리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나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
형의 가느다란 미소가 한숨으로 변하고 있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었지.”
“형님, 그런 경우가 형님을 힘들게 만든다면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닌지요.”
“흐 흐, 어디 지금 세상이 그렇더냐.”
세상일이란
이번에는 자조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다. 허망하다는 듯이 내뱉은 형의 그 말을 곰곰이 새겨보았다. 사실 현상태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균아.”
사명당의 목소리였다.
“형에게는 형이 거할 곳이 정해져있다고 생각함이 어떻겠느냐.”
무참하게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