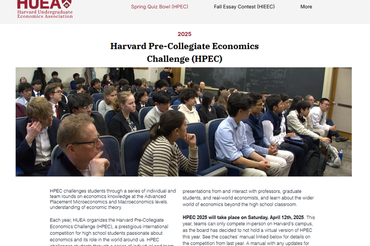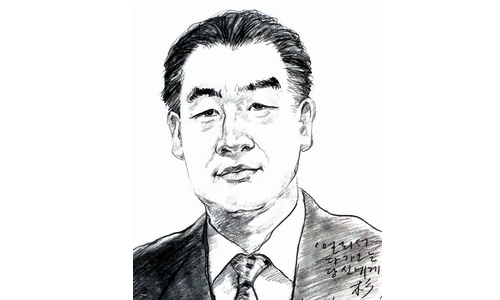
지난주 수요일 모 교수의 출판기념회에 초대받고 돈암동에 위치한 예약형 레스토랑 ‘89번가’를 찾았다. 참석자 중 필자와 공무원 여성 한 명만 빼고 모두 70년대생이었다.
저자의 책 소개가 간단히 끝나고, 주로 70년대생들의 학창시절 이야기가 시작됐다. 특히 병원 원장, 방송국 부장, 그리고 건축사무소 소장이 대화의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1989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선배 권유로 거리에 나가 데모를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순간 시간을 36년 전으로 돌려 1989년을 회상했다.
1989년, 그해는 한 시대의 경계였다. 동과 서를 가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한국의 청년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벽을 허문 해였다
당시 한국의 청년들은 권력을 향해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목소리를 던졌다. 80년 광주의 피로 시작된 시대의 싸움이 89년 청춘들에 의해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저항의 세대가 아니라, 완성을 위한 세대였다. 그해 6월 전국 곳곳의 대학가엔 최루탄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거리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그 때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대신 토론을, 증오 대신 연대를 말하기 시작했다.
89년의 청년들은 민주주의가 이긴 뒤에도 지켜야 하는 것임을 가장 먼저 깨달은 세대였다. 그들의 손끝에서 한국 사회는 변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대학은 자율을 찾았으며, 노동자들은 권리를 말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거리의 민주주의가 생활의 민주주의로 옮겨간 해가 1989년이었다.
필자는 ‘89번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 것과 초대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인 것, 그리고 89년도에 대학생이었던 자들이 많이 참석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초대 시간은 레스토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89번가’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일련의 상황은 필자가 36년이라는 시차를 무시하고 1989년과 2025년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1989년의 20대는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차돌처럼 단단했다. 거리의 구호, 강의실의 낙서, 명동의 행진 속에서 그들은 역사를 직접 움직였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의 20대는 달콤한 파스타와 잔잔한 대화를 나누며 SNS에 ‘좋아요’로 세상을 표현한다.
그 격차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부럽다. 싸우지 않아도 꿈꿀 수 있는 시대라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가 지켜낸 평화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자유가 누군가의 1989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1970년대생들의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필자는 ‘89번가의 간판 불빛이 단순한 레스토랑의 불빛이 아니라, 1989년의 민주화를 기억하게 해주는 등불이고, 세대와 세대가 만나 1989년 민주화의 완성을 이야기하게 해주는 등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89번가’의 파스타 접시 위에 놓인 소스처럼 36년 전 뜨거웠던 청춘의 흔적이 다시 한 번 사회를 바꾸길 바라면서, 1989년 청춘이었던 1970년대생들과 의미 있는 건배를 했다.
‘89번가’라는 이름은 레스토랑 이름과 과거의 향수를 넘어, 세대가 교차하는 징검다리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완성한 세대와 그것을 일상으로 누리는 세대가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야 ‘89번가’에서 누군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마주할 수 있다.
베를린의 벽이 무너진 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도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1989년의 정신, 즉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다.
1989년의 청춘들이 외친 말은 단순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두려움 없는 세상이다.” 그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그때의 용기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야 한다.
<김삼기의 시사펀치>는 “민주주의는 성숙한 제도가 아니라, 매일 다시 세워야 하는 습관이다”고 말한다. 1989년의 청춘이 그랬듯이, 오늘의 청년도 새로운 차원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다시 나서야 한다. 그러면 역사는 또 한 번 1989년 때처럼 바뀔 것이다.
1989년 대학로엔 ‘89번가’라는 오래된 표지판이 있었다. 사람과 생각이 오가던 거리였다. 정치인도, 노동자도, 학생도 그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주장이 달라도 대화는 이어졌고, 그 대화 속에서 사회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지만, 대화는 사라지고 이해는 끊겼다. 뉴스는 갈등을 키우고, 정치인은 분열을 자산으로 삼는다. 모든 게 움직이지만, 흐름은 멈춰 있다. 이제 대학로의 ‘89번가’ 표지판은 볼 수 없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일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대학로 89번가로 가자”고….
‘89번가’ 대표의 말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레스토랑 ‘89번가’는 대학로 89번지에서 시작해 돈암동으로 옮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