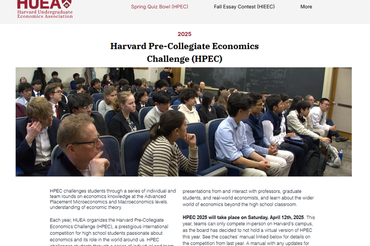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매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소소한 오류 바로 잡고 넘어가자.
매실나무와 매화나무에 대해서다.
일부 사람들이 매실과 매화나무를 별개로 오해하고 있다.
매실은 매실나무의 열매로 말이다.
그러나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를 지칭한다는 사실 밝힌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먼저 1928년 7월3일 <동아일보> 기사 인용해본다.
생선의 뼈를 연하게 하려면 일본 사람들이 먹는 매실장아찌(梅干)을 넣어도 좋다.
이를 인용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땅에서 언제부터 매실을 장아찌로 만들어 먹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기사를 살피면 일제치하 당시 매실장아찌, 아니 일본인들이 섭취하는 매간(梅干, 우매보시)이 이 나라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간이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히 친밀하고 중요한 반찬이라는 이유로, 배일감정으로 인해 한국인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 1990년대 초반 UR(우르과이 라운드)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정부 주도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벌이는 과정에 매실 등 상품성이 높은 작물들을 재배하며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민간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과정에 매실의 효능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매실장아찌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매실을 본격적으로 식용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매실을 그저 관상용으로만 대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매실은 유사 이래 소금과 함께 주요한 조미료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 이유로 염매(鹽梅, 소금과 매실)라는 단어까지 등장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1494) 9월 기록 살펴보자.
조미료로 소금 이상으로 활용된 ‘매실’
‘압권’은 명이 장아찌에 고기를 싸먹기
당시 우의정이었던 이극배가 병으로 사임을 청하자 성종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이가 더욱 많으며 덕이 더욱 높아 백성이 모두 바라보니, 술은 누룩으로 빚고 국은 매실로 만든다.
내가 네 도움을 어기겠는가? 마땅히 서로 기다리는 도리를 다해 무강한 아름다움을 비승(丕承, 이어 받들다)하며 굳이 사직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 직위를 힘써 편안히 하라.
국은 매실로 만든다는 말, 즉 성종이 국을 만드는데 이극배에게 매실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다.
이는 서경에 ‘잘 조화된 국물을 만들려 하거든 그대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 주오’라는 말에서 인용했는데 신하가 군주를 도와 선정(善政)토록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제 조선 중기 학자인 고상안(高尙顔, 1553∼1623)의 작품 매실을 읊다(詠梅實, 영매실)를 감상해보자.
庭梅有佳實(정매유가실)
뜨락 매화에 멋진 열매 있는데
可愛亦堪憐(가애역감련)
어여쁘면서 한편 가련도하네
自黃烟雨裏(자황연우리)
안개비 속에 절로 노란데
調鼎更何年(조정갱하년)
어느 해에 다시 조리하려나
상기 시 마지막 부분에 調鼎(조정)이 등장한다.
이는 음식물을 요리한다는 의미인데 매실로 음식을 만들겠다는 건지 혹은 조미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다.
여하튼 이를 살피면 과거에는 매실이 조미료로서는 소금 이상으로 활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일어난다.
[명이]
1934년 2월18일 <동아일보> 기사에 ‘폭설 내린 울릉도 상황’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춘궁기이면 산마늘 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구할 자 그 누구인가’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산마늘이 바로 명이의 다른 명칭이다.
명이란 명칭이 탄생되기 이전에는 ‘마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나물’이라고 해 산마늘(山蒜, 산산) 혹은 산에서 자생하는 파라는 의미로 산총(山葱)으로 불렸었다.
여하튼 명이를 식용했던 기록은 상기 <동아일보> 기사에 처음으로 실릴 정도로 오래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고려 말 우왕 시절부터 실시된 공도정책(空島政策, 섬 거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으로 사람이 살지 않던 울릉도에 조선 고종 19년에 실시된 개척령으로 사람들이 건너가 살면서 명이가 식용됐다고 한다.
내용인즉,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고 나자 앞서 <동아일보> 기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고, 식량을 찾아 울릉도를 샅샅이 뒤지던 중 눈 속에서 싹을 틔운 산마늘을 발견해 캐 먹고 목숨을 연명했단다.
그런 이유로 산마늘이 사람의 생명을 이어준다는 의미서 ‘명이’란 이름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역시 그런 이유로 명이는 울릉도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에 자생하는 명이는 희귀 나물로 보호받고 있고 지금 식용되는 명이는 사람들이 심어 가꾼 것을 쓰고 있다 한다.
그런데 이를 의아하게 여기며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 발견하게 된다. 1990년 8월4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다.
‘오대산·계방산에 산마늘 자생’이라는 제하로 ‘방부멸균력 특출, 고려 땐 국약으로 사용’이란 소제목으로 ‘강원도 오대산과 계방산에 희귀식물인 산나물(멩이풀)이 폭넓게 자생하고 있다’며 ‘생약명이 명총(茗葱), 산총(山葱), 산산(山蒜) 등인 산마늘은 고려시대에는 쑥과 함께 국약으로 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유황화합물질 등을 함유 천연 물질 중에서 방부력과 멸균력이 특출하다’고 기록돼있다.
이를 살피면 명이가 고려 시절 약용되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고려말부터 실시된 공도정책으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게 그 요인으로 보인다.
명이에 대해 간략하게 열거해봤으나 무엇보다도 압권은, 상기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명이 장아찌에 고기를 싸먹는 일이다.
그 맛,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별미임을 밝히며 이만 줄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