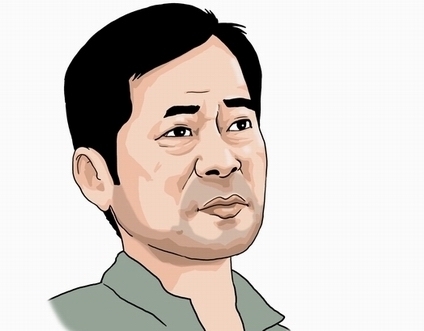
지난 연말에 여러 사람을 만났었다.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람들의 시각은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정치꾼들의 행태와 견줘봤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을 위한 조처라고 열변을 토했고, 자유한국당(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촌극을 연출할 정도였다.
여론과 정치꾼들의 행태를 살피며 안타까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꾼들의 지독한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치꾼과 국민은 결국 동일체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마저 일어났었다.
각설하고,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필자는 여러 차례에 검찰 개혁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전 세계서 대한민국 검찰만이 모두 지니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그런 필자로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공수처 신설은 이 시대의 소명으로 자리매김한 검찰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렇다. 신설된 공수처는 단적으로 언급해서 검찰이 지니고 있는 폐해를 넘어서는 더욱 강력한 권력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역설하지만, 결코 견제 차원이 아니다. 통과된 법안을 살피면 공수처는 경찰청과 검찰을 장악하는, 검찰이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넘어 ‘나는 새도 떨어트릴 수 있는’ 기형의 권력기관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설령 공수처가 견제수단이라 강변해도 견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견제가 주는 의미를 수차례 견지해왔다.
권력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된 권력을 지니고자 하는 욕심서 비롯되고, 결국 그 권력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듯, 공수처 신설은 결코 검찰 개혁의 본질이 될 수 없다.
다음은 공수처 신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지난 주 인용했던 헌법 조항을 다시 인용해본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11조 1항과 2항이다.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다.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동 조항을 세밀하게 살피면 공수처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차별 받지 않으며 그를 위한 어떤 제도도 인정되지 않고 창설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우리 사회서 ‘고위공직자’라는 특수계층을 인정하며 그들을 위한 단체를 설립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살필 때 국민들은 공수처를 검찰이 행했던 폐해에 대한 응징의 차원으로 바라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검찰보다 더욱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변질되리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런 경우 우리 사회는 공수처를 장악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방식일까. 판단은 독자들께 맡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